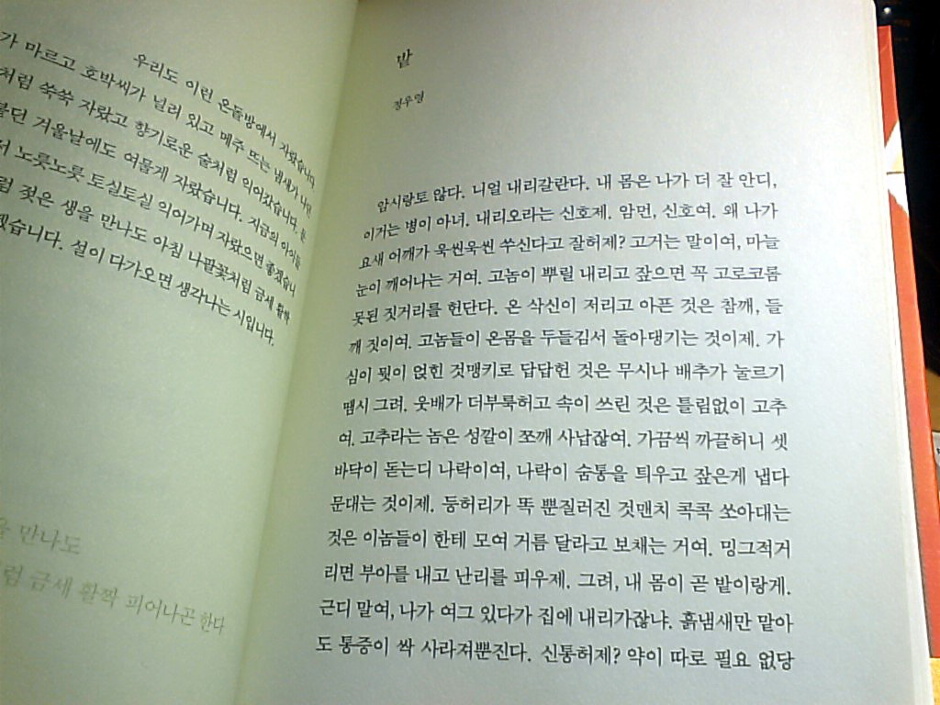<꽃잎의 말로 편지를 쓴다>를 펴 들었다.
고두현의 '늦게 온 소포'를 여기다 옮겨본다.
늦게 온 소포
고두현
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 한다.
서투른 글씨고 동여맨 겹겹이 매듭마다
주름진 손마다 한데 묶여 도착한
어머님 겨울 안부, 남쪽 섬 먼 길을
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.
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
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한
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
속엣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 보낸
소포 쓴 찬찬히 풀다보면 낯선 서울살이
찌든 생활의 겉꺼풀들고 하나씩 벗겨지고
오래된 장갑 버선 한 짝
해진 내의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 줄 따라
펼쳐지더니 드디러 한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
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아홉 개.
<큰집 뒤따메 올 유자가 잘 댔다고 몃개 따서 너어 보내니
춥을 때 다려 먹거라.고생 만앗지야 봄볕치 풀리믄 또 조흔
일도 안 있것나.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
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리라>
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
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
남향이 문 닫지 못하고
무연히 콧등 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
새벽 눈발이 하얗에 손 흔들려
글썽글썽 녹고 있다.
'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거다'
이 말은 어디서 들어 본 적이 있는 말이다 했더니
바로 내 어머니가 한 말이다.
'항상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거라'
또 그리움이 사무쳐온다.
책장을 넘기면서 또 시 한편을 읽다가
한참을 책장을 덮은 채 시를 되뇌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..
문정희의'한계령을 위한 연가'다.
몇일전 회사에 출근해서 웹을 뒤적거리다가 본
이 시가 올라 온 그 날 아침에는 눈이 내려서 그랬던가?
가슴에 와 닿았던 기억이 새롭다.
그런데 오늘 다시 책으로 이 시를 읽으니
그때의 기억까지도 보태져서 더 새롭다.
시를 만나는 일은 이렇듯 매순간이 다르다.
그리고 이 책을 통틀어 가장 감명깊게 공감한 시로는 정우영의 '밭'이라는 시다.
이월 셋째주라고 적혀있고 오늘이 그중간에 있는 날이기도 하다.
밭
정우영
암시랑토 않다.니얼 내리갈란다. 내 몸은 나가 더 잘 안디,
이거는 병이 아녀, 내리오라는 신호제. 암먼, 신호여, 왜 나가
요새 어깨가 욱씩욱씬 쑤신다고 잘허제? 고거는 말이여, 마늘
눈이 깨어나는 거여. 고놈이 뿌릴 내리고 �으면 꼭 고로코롬
못된 짓거리를 헌단다. 온 삭신이 저리고 아픈 것은 참깨,들
깨 짓이여, 고놈들이 온몸을 두들김서 돌아댕기는 것이제. 가
심이 뭣이 얹힌 것맹키로 답답헌 것은 무시나 배추가 눌리기
땜시 그려, 웃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린 것은 틀림없이 고추
여. 고추라는 놈은 성깔이 쪼깨 사납잖여. 가끔씩 까끌허니 셋
바닥이 돋는디 나락이여, 나락이 숨통을 틔우고 �은게 냅다
문대는 것이제. 등허리가 똑 뿐질어진 것맨치 콕콕 쏘아대는
것은 이놈들이 한데 모여 거름 달라고 보채는 거야. 밍거적
거리면 부아를 내고 난리를 피우제. 그려, 몸이 내 몸이 곧 밭이랑게.
근디 말여, 나가 여그 있다가 집에 내리가잖냐. 흙냄새만 맡아
도 통증이 싹 사라져뿐진다. 신통허제? 약이 따로 필요없당게.
하이고, 먼 지랄로 여태까장 그 복잡헌 디서 뀌대고 있었다냐
후회막심허지. 인자 내 말 알아들었제? 긍게로 나를 짠
하게 생각허덜 말그라. 너그 어매는 땅심으로 사는 사람이여.
나가 땅을 버리면 아매도 내 몸뚱이가 피를 토할 거이다. 그러
니 내 말 꼭 명심히야 써. 어매 편히 모시겠다는 말은 당최 꺼
내지도 마라. 너그 어매 죽으라는 소린게로, 알것제?
'몸이 밭이고 밭이 몸인 어머니'를 읽으면서 난 또 코끝이 찡해온다.
시집 한권이 주는 기쁨이 이리도 크다.
어머니가 생각날 때 읽어도 좋고, 꽃이 보고 싶을 때 읽어야겠다.
동생의 힘없는 목소리가 내내 걸린다.
두아이 엄마지만 집안의 막내인 동생.
아픈 아이 안고 발만 동동 구르고
속은 얼마나 탔을꼬~
말없이도 안아줄 어머니도 안계신데......!
가슴 한켠에 휑하니 바람이 분다.
'찬이가 소망하는 세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호미도 날히언 마라난.... (0) | 2008.02.27 |
|---|---|
|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잘했소! (0) | 2008.02.24 |
| 아 삐리리~~ (0) | 2008.02.15 |
| 여러분!!!!!!福 많이 받으세요!! (0) | 2008.02.06 |
| 파올로 코엘료의 "순례자" (0) | 2008.02.03 |